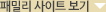자료실
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과거사업에 대해 만나보세요.
| [영화속 장애인 이야기-남경욱]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을 그린 영화 "못" | |
|---|---|
| 사업영역 | [활성] 장애인식개선사업 > [활성] 칼럼/에세이 |
| 등록일 | 2020-08-05 오후 8:16:57 |
|
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을 그린 영화 [못]
남 경 욱 박사
(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)

오래 전 어느 TV 오락 프로그램에 ‘인생극장’이란 코너가 있었다. 우연히 맞이하게 된 인생의 갈림길에서 “그래, 결심했어!”라는 말과 함께 주인공이 내린 결정이 가져오는 가상의 결과들을 차례로 보여주는 식이었는데 꽤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. 그 코너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이끈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.
지금부터 필자는 독자들을 인생극장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려 한다.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. 당신이 고등학교 졸업을 며칠 앞 둔 어느 날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. 그 자리에는 다른 세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여학생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여학생이 사망했다.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고를 낸 친구는 이미 그 여학생과 사귀던 사이였다. 그리고 그 친구는 당신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던 이웃 남자의 아들이기도 하다. 그런 친구가 당신의 연인을 죽게 만든 것이다. 만약 그 친구가 지금 당신이 보는 앞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당신은 그 친구를 구하겠는가?
사실 위 상황은 필자의 상상이 아니라 영화 ‘못’의 전반부 내용이다. 친구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혼자 힘으로 살아나온 그 친구는 아무도 모르게 고향을 떠나버렸고 주인공과 다른 두 친구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트라우마(Trauma, 정신적 외상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)로 남게 된다. 그래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의 죽음, 친구의 행방불명 그리고 위기에 처한 친구를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기억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주인공을 괴롭히고 있었다.
이렇게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 겪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, 회피, 불안의 심리상태를 일컬어 정신의학계에서는 ‘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(PTSD: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)’라고 부른다. 대다수 사람들도 이 영화만큼 극단적인 경험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, 주로 간절히 품어왔던 기대가 꺾이거나 바람직해야 할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그 원인이 된다. 문제는 그 다음이다. 자신에게 아픈 상처를 준 대상과 어떻게 다음 만남을 가져야 할까? 만약 인생극장 코너였다면 주인공 앞에 한 길은 용서를 통해 그 대상과 화해하는 길이, 또 다른 길은 내가 당한 고통만큼, 아니 그 몇 배의 복수를 시도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. 영화 속 인물들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정은 그들을 트라우마의 연못에 깊숙이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.
사실 피상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. 그러나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?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위협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면부지 타인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이들이 있는 세상에서 이 영화 속 설정 혹은 그 이상의 트라우마를 가져오게 한 대상들을 모두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. 내공(?)이 미천한 필자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분노 앞에선 말초신경들이 먼저 반응할 수도 있고 복수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짐작을 해볼 뿐이다.
영화 제목인 동시에 포스터 배경으로 나오는 못을 보면서 신선한 물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연못을 떠올려 보았다. 필시 물고기와 수초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. 그것은 못 속처럼 잘 보이진 않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? 트라우마와 복수라는 벽돌로 둑을 쌓아 마음에 드나들어야 할 모든 것들을 차단해 버린다면 이 영화 속 인물들처럼 우리들 마음은 이내 썩어들어 갈 것이다. 그렇기에 용서와 화해라는 다소 우리 능력 밖의 것처럼 보이는 시도는 비록 현실적이지도 미덥지도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의미 있는 삶으로 되돌리기 위한 일종의 리셋 스위치로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.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