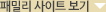자료실
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과거사업에 대해 만나보세요.
| [호주칼럼-황윤숙] 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것 | |
|---|---|
| 사업영역 | [활성] 장애인식개선사업 > [활성] 칼럼/에세이 |
| 등록일 | 2020-07-16 오전 9:47:19 |
|
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것
황윤숙 (호주 Griffith 대학 특수교육과 조교수)
호주는 지금 한겨울이다. 겨울이라지만 이곳 브리스번에서 푸른 잔디와 유채색의 꽃을 피워내는 나무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. 따스한 햇살을 등 뒤로 서늘한 강바람을 맞으며 동네 공원을 걷던 저자의 시야에 열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사내 아이가 걷다가 갑자기 주저 앉고, 뛰다 갑자기 멈춰서서 무언가를 응시하는 모습이 들어왔다. 팔꿈치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며 그 사내 아이가 뛰면 따라 뛰고, 멈추면 반사적으로 멈추던, 아이의 몸동작 하나하나에 촉각이 맞춰져 있던 여린 몸집의 배낭을 맨 젊은 여자에게 눈길이 멈췄다.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, 주말이면 놀이 그룹과 함께 공원을 찾거나 가족 쇼핑을 즐기는 게 다반사인 이 곳에서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만의 동떨어진 모습은 새삼 도드라지게 다가왔다. 주변 사람과 사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도 끊임없이 관심거리를 찾아내는 아이 모습,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아마도 그 사내 아이가 장애인일 것임을 짐작케 했다.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로 산다는 것. 그건 동양과 서양을 벗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가 보다. 기억은 십 수 년 전 가르쳤던 제자들과 학부모들로 옮겨간다.
<브리스번의한공원>
일층 출입구 옆 교실은 등교하는 아이들로 늘 북적거렸다. 원적반 교실로 가는 길에 열린 교실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슬그머니 웃어대는 것으로 아침인사를 대신하던 아이들. 거의 매일마다 보는 얼굴이건만 한결같이 우렁찼던 엄마들의 인사소리가 그 아이들을 뒤따랐다. “선생님 안녕하세요?”. 스무명이 훌쩍 넘는 아이들과 가는 현장학습에서도, 한 달에 두 번씩 요리를 통해 국어와 수학을 배우던 날에도 엄마들은 종종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었고, 손과 발이 되었다. 학부모와 특수교사. 가끔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었고, 그래 서로를 속상하게 했던 적도 있었지만, 서로의 고충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던 관계. 이제는 20대 중반의 어른이 된 한 제자의 사진을 보고 있다.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밭을 가는 모습이 의젓하기도 하지만, 그 동안의 세월이 느껴져 왠지 계면쩍기도 하다. 이렇게 늠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제자의 어머니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자식에게 당신의 온 촉각을 맞춰 오셨을까? 요즘은 아이가 혼자 집에 올 수 있도록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느라 바쁘다고 하신다. 이메일에 적힌 그 분의 말씀처럼 옆 동네에 가까이 있다면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두 손 꼭 잡아드리고 싶은 날이다.
|
|